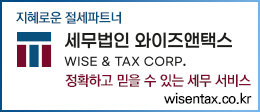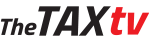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992년 이후 33년간 우리기업이 미국에만 특허등록을 하고 국내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를 보유한 미국기업에 특허 사용 대가를 지불해왔던 것을,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게 됐다. 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추산해도 4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판례 변경으로 우리 기업들의 특허 사용료 지급은 현재 불복 중인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8일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대해서는 특허 등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한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하고, 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국가가 원천지국으로서의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
그동안 국세청은 우리 기업이 제조 등의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 등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 이러한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왔으나 법원은 특허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는 한․미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 행사의 전제인 우리나라에서의 사용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국세청은 국내 원천지국 과세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세청은 특허의 사용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한 이후, 본청과 지방청을 포함한 미등록특허TF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국세청은 TF를 통해 국제조세 전문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맞춤형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내부 변호사, 소송수행자 등과 본청이 협의하여 대응 논리를 보완하고 논리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왔으며, 1979년 발효된 한‧미 조세조약의 체결과정을 추적해 50년이 다 되어가는 1976년 당시의 입법자료를 찾아 내기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조약의 문맥 해석에 대한 새로운 대응논리를 마련해 제출했다.
당시 우리 국회가 사용료는 대가를 지급하는 국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한‧미 조세조약을 비준한 것으로 해석되는 자료와 논리 등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국가간 정보교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우리와의 조약체결 상대국인 미국에서도 특허의 등록지 기준이 아닌 실제 사용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자료와 관련 학술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송수행자에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소송에 임해 주어 감사하며, 오늘의 결과가 곧 국세청의 저력을 보여 주는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밑바탕이 되는 국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당한 과세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